G마켓이 오는 12일까지 실시하는 명절 빅프로모션 ‘2026 설 빅세일’에 ‘온에어 핫템’ 코너를 추가하고, 그룹 H.O.T.의 광고 영상 속 상품을 모아 할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온에어 핫템은 G마켓이 지난 1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H.O.T.의 설 빅세일 광고 영상 7편에 등장하는 상품으로 구성했다. H.O.T.의 대표곡 가사에 유쾌하게 녹여낸 ▲한우 ▲간장게장 ▲먹태 ▲가쓰오 우동 ▲컴퓨터 ▲파스 등이다. ▲식품 ▲패션 ▲건강용품 ▲디지털 카테고리 추천 상품도 함께 특가 딜로 구성해 매일 자정마다 6개씩 선보인다. 최대 75% 할인 판매하는 초특가 한정 수량 상품이다.3일에는 ‘라오메뜨 전설의 패치 레전드 파스’와 ‘풀리오 풀리지 허벅지 종아리 마사지기’ 등을, 4일에는 ‘신선집중 연평도 암꽃게 간장게장’, ‘스팸 스마일 4호 선물세트’ 등을 제안한다. 오는 5일에는 ‘갤럭시탭 S11 128GB’, ‘LG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등을, 6일에는 ‘팔콘S 천연가죽 안마의자’, ‘락토핏 골드 50포*6통’ 등을 할인 판매한다. 자세한 내용은 G마켓 설 빅세일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G마켓에 따르면 데뷔 30주년을 맞은 H.O.T.가 25년 만에 5인 완전체로 참여한 설 빅세일 광고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개했던 티저 영상은 지난 2일 기준 480만뷰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공개한 7편의 본편도 하루 만에 누적 1000만뷰를 초과 달성 중이다. G마켓의 핵심 고객인 3040세대를 대상으로 추억 속 H.O.T.의 무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G마켓 관계자는 “유머러스한 광고에 등장하는 상품을 실제 행사에서도 파격 특가에 선보여 쇼핑하는 재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명절, 새 학기 시즌을 맞아 구매하면 좋을 상품으로 엄선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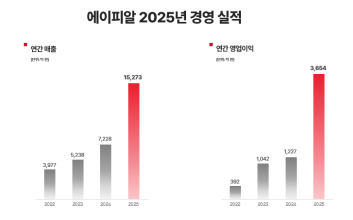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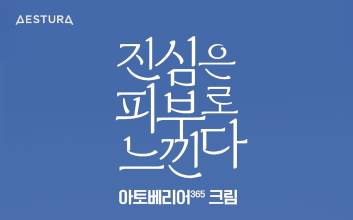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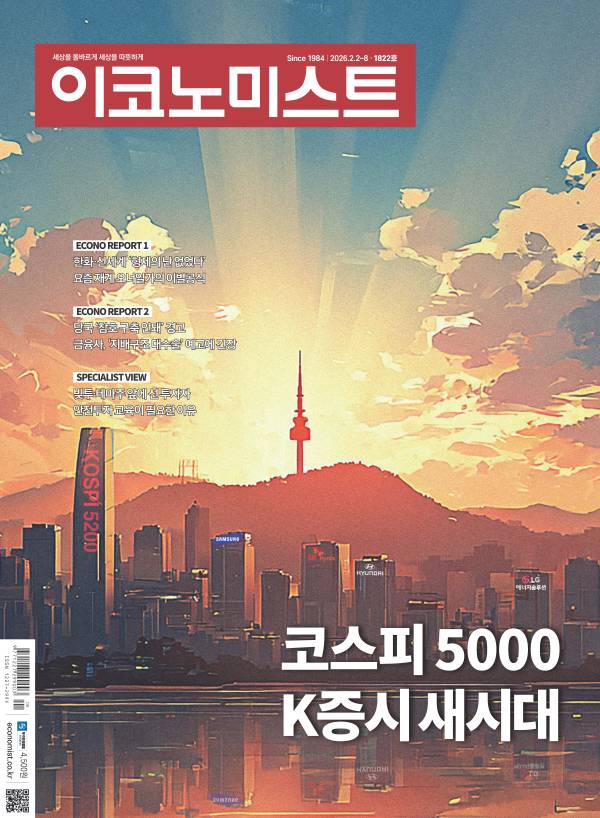
![썰풀이 최강자 ‘다인이공’...정주행 안 하면 후회할 걸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4/isp20260124000086.400.0.jpeg)
![‘중티’ 나는 남자와 ‘팩폭’ 날리는 여자, 시트콤보다 더 시트콤 같은 ‘여단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1/isp20260111000031.400.0.jpg)


